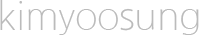배우 차지원의 주연작 영화 '빛과 몸'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5 08:13본문
배우 차지원의 주연작 영화 '빛과 몸'(Body of Light)이 제47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 됐다. ⓒ '빛과 몸'은 지난 23일과 24일 제47회 모스크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초청은 한국 독립영화가 국제 무대에서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빛과 몸'은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 한나가 춘천에서 깨어난 뒤, 자신과 닮은 실종 전단지를 발견하며 50년 전의 사건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드라마다. 과거의 인연과 죽음을 마주하며, 운명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한나의 여정을 그려냈다. 무속신앙과 윤회라는 한국적 주제를 문화적 경계에 선 이방인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해외 관객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한나 역을 맡은 차지원은 캐나다에서 성장한 이민자로서의 배경을 살려, 문화적 소외감과 동시에 뿌리를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을 진정성 있게 표현해냈다. 그의 섬세한 감정 연기는 작품의 중심축을 잡아주며 몰입을 이끌었다.차지원은 "삶과 죽음, 그리고 운명이라는 주제는 보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도, 결말도 달라지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빛과 몸'이라는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빛과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고 느꼈고, 그 빛이 무엇이며 그 무게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한나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이어 "하지만 그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정서를 해외에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두 문화 사이의 연결지점이 되어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빛과 몸'은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됐으며 국내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68년 이후 지난해까지 57년간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전 지구 평균보다 2.1배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규모가 역대 가장 컸는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립수산과학원은 24일 우리나라 해역 기후변화 현황과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 수산업 영향 등을 분석한 ‘2025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주변 표층수온은 1.58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7개 정점에서 각 14개 표준 수층을 매년 6회 반복 조사한 결과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수온이 0.74도 올랐다. 국내 바다 가운데 동해 수온 상승 폭(2.04도)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6∼8월 동해에 평년(30년 평균) 대비 20% 높은 난류가 유입되면서 열에너지 공급이 늘어난 결과다. 서해는 1.44도, 남해는 1.27도 올랐다. 수온 상승의 주된 원인은 여름철 폭염이 거론된다. 태양열을 받아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높은 찬물은 깊은 바다에 남는 성층(成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고수온 특보는 71일간 이어지며 2017년 고수온 특보 발령제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했다.고수온은 해양 기초 생산력을 낮춰 어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 생산력을 나타내는 클로로필-a(세균을 제외한 모든 광합성 생물에 존재하는 엽록소) 농도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21.6% 줄었다.고수온에 따른 어업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양식업 피해가 크다. 고수온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역대급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 피해액이 1430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어획량도 줄었다. 2024년 멸치 생산량은 12만 t으로 전년(14만7800t) 대비 18.8% 줄었다.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멸치 먹이들이 녹아버린 것. 수온 변화에 민감한 갈치와 살오징어는 각각 26.7%, 42.3%씩 어획량이 줄었다.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84만1000t으로 연간 150만 t가량의 어획량을 올렸던 1980년대의 절반 수준이다.
부산헌옷방문수거 마케팅프로그램 플레이스상위 구글상단노출 키워드한줄광고 부산헌옷방문수거 구글상단노출 마케팅프로그램판매 사이트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다산동부동산 홈페이지상위노출 웹사이트상위노출 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플레이스상위 네이버상위노출 네이버상위노출대행 쿠팡배송기사 네이버상단작업 웹SEO 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구글상단작업 키워드한줄광고 홈페이지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구글상단작업 마케팅프로그램판매 네이버상단작업 네이버상위노출대행 다산동부동산 웹SEO 상위노출 사이트 네이버상위노출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마케팅프로그램 웹사이트상위노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